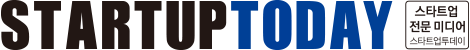도시재생 뉴딜과정 최고전문가 과정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즉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 전면철거나 아파트 위주로 대규모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환경 측면에서의 미흡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도시재생은 사람, 장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문화·경제·환경재생을 통해 정비·보전·관리 측면에서 조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형태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거주민 중심의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모델로 변화했다.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과정 최고전문가 과정에서 ‘해외 도시재생 사업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강의를 통해 제임스 반스(James Vance)의 도시성장의 7단계 모델인 ‘시작→배척→분리→확장→복제→조정→재생’을 소개하며 “도시가 생성과 성장, 쇠퇴의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도시재생순환체계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도시재생에 담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활성화, 스마트 축소 등을 꼽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뉴어버니즘 운동이 펼쳐졌고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콤팩트 시티, 어번 빌리지 운동, 도심재생 등이 진행되어 왔다(지속가능성). 또한 2000년대 이후 사회에 대두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은 대체로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하게 됐는데, 이러한 지향점은 대부분 커뮤니티 구성원의 주도에 의해 진행됐다(커뮤니티 활성화).
스마트 축소는 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해 그 도시에 맞게 인구, 건물, 토지이용 등의 규모를 산정하고 덜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스마트 축소는 축소 근린에 대한 도시재생의 이념이자,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과 시설의 네트워킹, 빈 공간을 개발 이전의 상태로 회귀, 녹지화 등 주민의 수요에 따라 공간의 밀도를 낮추는 ‘공간계획’의 방식으로 적용됐다. 이는 기존의 과잉성장이라는 재생의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고, 스마트 축소를 전제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중심가로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했다. 중심가로형 도시재생은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방식과 영국의 하이 스트리트(High Stree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구도심지의 쇠퇴한 중심가로의 역사적 정체성과 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재생정책으로, 미국 역사보전 트러스트에 의해 지방도시의 중심가로에 입지한 역사적인 상업건물들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시작된 지역 보존운동의 한 유형이다. 2011년 기준으로 43개 주의 약 2,000여 도시에서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효율성이 높은 지역보존형 경제개발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영국의 런던은 2000년 이후 온라인 상권의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 유통시설이 교외지역에 입지함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 근린상업가의 상권이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로변 상점의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주변지역의 쇠퇴로까지 확장되면서 빈 상점이 발생하게 됐다. 저층주거지의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시는 근린상업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이 스트리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2014년 기준으로 런던 전역에 걸쳐 7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집행처에 따라 런던시가 운용하는 OLF(Outer London Fund)와 Regeneration Fund, 영국 중앙부처 중 하나인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운용하는 Portas Pilot Initiative의 예산이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투자되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도시재생 사례로 영국도시재생협회로부터 2001년 최고의 모델로 선정된 맨체스터(Manchester) 노스무어(Northmoor) 주거지, 런던 킹스크로스(King’s Cross) 재생사업, 불링(Buring) 재생사업을 꼽았다. 또한 스페인의 산 미구엘 마켓(Market of San Miguel), 메트로폴 파라솔(Metropol Parasol), 구게하임미술관, 미국의 아틀란틱 스테이션 재생사업, 뉴욕 실리콘 앨리, 뉴욕 하이라인 파크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시재생의 여지가 많은 소외되고 침체된 지역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 이미지와 결합해 양질의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는 공간개발전략의 추구와 권역계획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