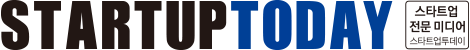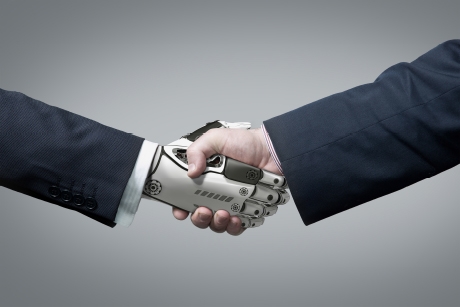
19세기 초반, 호주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유럽인들은 그 곳이 비옥하고 푸르른 대지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듯한 이 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호주의 드넓은 땅이 대부분 사막이나 다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단지 유럽인들이 이주를 시작한 시점이 드물게 찾아오는 매우 운 좋은 ‘농업의 황금기’였을 뿐이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2005년 출간한 《문명의 붕괴》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문득 자문해본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런 불행한 행운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운 좋은 황금기가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우리 인류는 오래 전부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궁극의 만능 기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불과 십 수년 전에 이에 근접하는 기계를 발명하고 그 이름을 ‘컴퓨터’라 붙였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 아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똑똑한 기계는 지난 해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바둑 대결 이후부터 행운과 같은 기술 전성시대를 잠시 선보인 뒤, 이제 일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 산업 경제국가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신 ‘인더스트리 4.0’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유난히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최신성에 민감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열기가 과열된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게 의뢰 오는 강의나 원고의 주제에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부쩍 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담론에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는 단지 기술적 혁신이 바꿀 불확실한 미래 때문만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많은 삶의 규칙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4차 산업 혁신 대상은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모두일 것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진보하는 기술들의 영역 확대로 정부, 사회 구성원 모두 공공 이익과 혁신적 기술 발전의 사적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에 대해 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2005년 출간한 《문명의 붕괴》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문득 자문해본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런 불행한 행운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운 좋은 황금기가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우리 인류는 오래 전부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궁극의 만능 기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불과 십 수년 전에 이에 근접하는 기계를 발명하고 그 이름을 ‘컴퓨터’라 붙였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 아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똑똑한 기계는 지난 해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바둑 대결 이후부터 행운과 같은 기술 전성시대를 잠시 선보인 뒤, 이제 일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 산업 경제국가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신 ‘인더스트리 4.0’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유난히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최신성에 민감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열기가 과열된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게 의뢰 오는 강의나 원고의 주제에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부쩍 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담론에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는 단지 기술적 혁신이 바꿀 불확실한 미래 때문만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많은 삶의 규칙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4차 산업 혁신 대상은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모두일 것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진보하는 기술들의 영역 확대로 정부, 사회 구성원 모두 공공 이익과 혁신적 기술 발전의 사적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에 대해 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노동자의 탄생은 좋은 학교를 마치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을 구하는 교육과 노동의 순차 규칙을 따랐지만, 이제는 경계가 모호해진 직업과 기술 발달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무엇을 기계와 ‘함께’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정확히 무엇을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가장 가까운 미래 4차산업 혁명에 유망한 산업은 새로운 교육과 이 교육 체계를 지원하는 훈련 시스템에 관한 고민이 아닐까? 이제 교과서를 외우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 빡빡한 삶을 생각하며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전환기의 삶 역시 완전히 다른 의미로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결국 가장 가까운 미래 4차산업 혁명에 유망한 산업은 새로운 교육과 이 교육 체계를 지원하는 훈련 시스템에 관한 고민이 아닐까? 이제 교과서를 외우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 빡빡한 삶을 생각하며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전환기의 삶 역시 완전히 다른 의미로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